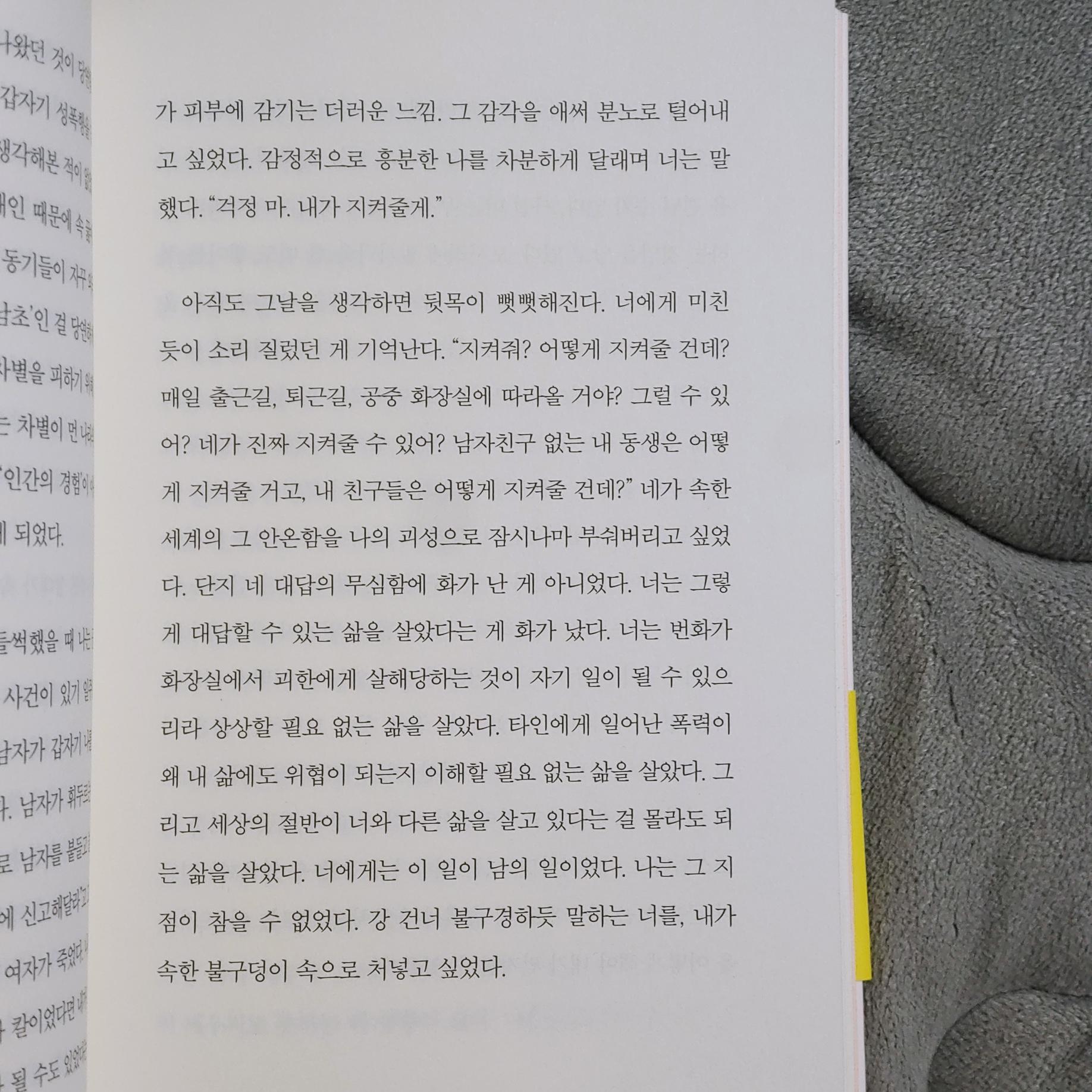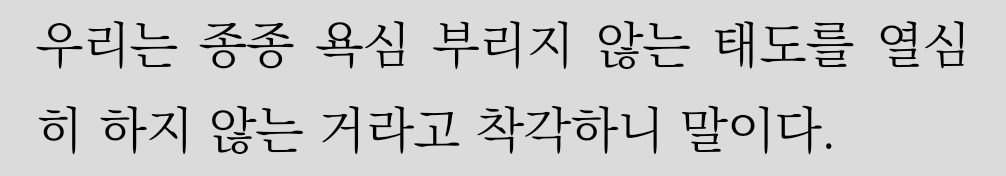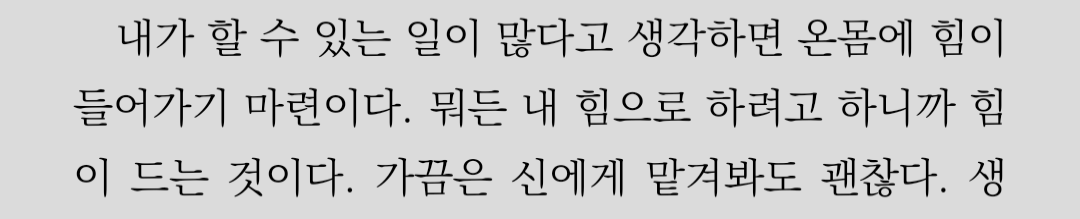페이스북에서 그의 글을 읽는 걸 좋아했다. 몇 년 전부터 블루일베에 발을 들이지 않으면서 그런 즐거움은 잃었지만 여전히 가끔씩 어디선가 그의 글을 찾아 읽곤 한다. 그의 생각들과 상상력과 문체를 좋아한다. 책과 함께 발매됐던 그의 앨범도 좋아한다. 생각난 김에 가장 좋아하는 '클랩함 정션으로 가는 길'을 오랜만에 들었다.
"마음이 무얼까."
EP가 나온 게 2015년이었다니, 그 때의 나를 생각하면 정말 옛날이구나. 하긴 3년밖에 안 지났네. 그간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는 나와 참 다른 사람이면서도 비슷한 면이 많다는 걸 책을 읽으면서 알았다. 같은 생각들을 만나 반가웠다. 그가 어릴적 친구들이나 전남편 무리로부터 느꼈던 이질감도 내가 최근 속했던(or 여전히 속해있는) 집단으로부터 느끼는 것과 비슷했다. 사랑으로, 미숙함으로 받은 상처들,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한 삶에 대한 이질감도 그랬다. 그리고 혼란스러움도 그랬다.
많이 울기도 했다. 딸에 대한 글인 '나는 네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에서 그랬고, 우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 그랬다. 특히 후자에서 많이 울었다. 그렇게 운 건 오랜만이었다. 남겨둔 항우울제가 있었으면 먹고 싶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왜인지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눈물이 많이 흘렀다. 왜 그랬을까? 지난 상처들이 떠올랐을까? 아직 아물지 않은 걸까? 삶은 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나도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그 말이 왜 그렇게 직관적이지 못할까?
딸에게 보내는 글과, 나를 한 권의 책처럼 대우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전자에는 많은 마음과 바람들이 꼭꼭 눌러담긴 것 같았고, 후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듯했다. 나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리고 나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다.
오늘은 <다 큰 여자> 앨범을 다시 들어야겠다. 새롭게 다가오겠지.